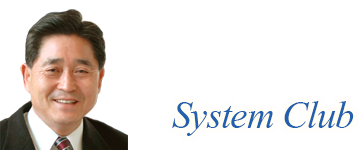[지만원 메시지(86)] 지만원 족적[3] 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9 00:05 조회10,51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지만원 메시지(86)] 지만원 족적[3] 1~2
1. LA에서 눈뜬 세계경제
1987년 2월 말, 나는 국방연구원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육군대령으로 예편했다. 1966년 소위로 임관한지 22년 만이었다. 1987년 여름 미 해군대학원에 취직을 하면서 LA에서 열리는 국제경제 세미나에 여러 차례 참석하는 기회를 가졌다. 발표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세미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아시아의 세 마리 용이라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의 성장동력에 대한 비교였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일본의 성장동력에 대한 비교였다.
한국은 대만 및 싱가포르와 어떻게 다른가
당시 세 나라는 다 같이 10%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구가했지만 성장동력은 각기 달랐다. 한국은 기능공에 의한 성장이었고, 나머지 두 나라는 설계인력에 의한 성장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따라서 한국의 부가가치는 낮고, 다른 두 나라의 부가가치는 높다고 했다. 이는 내가 생각해도 맞는 말이었다. 한국이 뒤늦게 ‘3마리 용’이라는 대열에 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기발한 드라이브 덕분이었다. 용의 대열에 끼어들기 전까지 한국은 두 나라에 비해 많이 뒤지는 후진국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드라이브
박정희 대통령은 느닷없이 기능공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기능공들은 서독에서 열리는 기능올림픽에 나가 1, 2, 3등을 휩쓸었다. 대통령들은 이들을 초청하여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격려했다. 국제사회에 한국은 기능공의 나라로 대서특필되었다. 대통령은 선진국들에 특사를 보냈다. “한국에는 착실하고 온순한 기능공들이 많으니 한국 공단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고 세일을 했다. 창원공단, 구미공단, 인천공단, 울산공단 등에 선진국들이 속속 들어와 공장을 지었다. 실업률 30%의 나라가 구인난을 겪을 만큼 일자리가 늘어났다. 공장장이 사장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았다. “공부해야 소용없다. 기술이 있어야 잘 산다.”
한국 청년들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 나라는 단연 일본이었다.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일본기업이 공단의 주류를 이루다보니, 소재, 부품, 생산기계가 일본에서 조달됐다. 만일 일본이 저 멀리 아프리카 희망봉에 위치했다면 당시의 경제성장은 어려웠을 것이다. 일본이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었다면 ‘한강의 기적’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에서 조립된 제품은 당시 베트남 참전을 고맙게 생각하는 미국이 호의적으로 수입해주었다. 한국 생산기반은 조립생산 기반이었다. 따라서 자체브랜드가 없는 OEM상품 뿐이었다. 그래서 당시 한국경제를 ‘통과경제(Transit Economy)’라 불렀다. 일본의 소재와 부품을 들여다 일본의 조립설비로 조립해 미국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여객기를 환승할 때 ‘통과여객실’에 머물렀다 환승하는 모습과 유사한 경제라는 뜻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산화 기반 만들기
단순 조립생산은 장래성이 없다. 이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필요단계이지만 오래 안주해서는 안되는 시스템이었다. 대통령은 국산화를 시작했다. 선진국에서는 한물 간 사양품(Sunset Item)을 국산화하기 시작했다. 방직기, 전화기, 차량, 소총, 박격포 등 선진국에서는 곧 폐기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자료(TDP: Technical Data Package)를 선박으로 대거 실어왔다. 마스터설계, 부품과 구성품에 대한 세부설계, 스펙에 대한 설명 등 문서량이 품목당 수 톤에 달했다. 아무것도 생산해 본 적이 없는 기업들이 품목을 할당받았지만 기술자료를 읽을 줄도 몰랐다. 그래서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출신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 주면서 귀국하게 했다. 오늘의 생산기술을 터득시키고 훈련시킨 사람들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사람들이었다. 군사제품은 ADD(국방연구소)에 유치된 과학자들이 생산하기 시작했다.
일본경제와 미국경제의 비교
국방연구원에 있는 동안 나는 경제와 경영에 대해 미국에서 배운 교과서 실력에 머물러있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는 1982년 미국 시민들의 승용차 선호도 조사에서 일제차가 1, 2, 3위를 차지했고, 미국 차는 겨우 7위에 머물러 잇었다는 사실이었다. 내 주위의 교수들 모두가 혼다가 최고라며 혼다 찬양자들이 돼 있었다. “왜 비싼 돈 주고 금방 부서지는 차를 사겠느냐?” 이것이 미국교수들의 미국 차에 대한 불신이었다. 다른 하나는, 드라이브 도중 라디오를 켜면 미국경제를 성토하는 토론들이 방송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을 배워야한다며 일본의 생산시스템과 일본식 경영을 소개하는 책들이 나왔다. 일본경제가 1위, 독일경제가 2위, 미국경제가 3위라는 볼멘 소리들이 쏟아졌다. 이에 레이건 대통령은 ‘블루리본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안을 창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구 결과, 위원회는 미국경제의 상대적 낙후성을 지적하고 일본의 생산시스템을 단기에 따라잡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미국은 많은 연구개발비를 들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긴 하는데 그 기술은 ‘종이기술(Paper Technology)’에 머물러있는데 반해, 일본은 그 종이에 담긴 미국기술을 ‘생산기술(Production Techonology)’로 전환하여 돈을 버는 데 천재적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미국이 살 길은 IT와 BT, Information Techonology와 Biological Technology,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이라고 건의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경제를 다시 1위로 올라서게 한 처방이었다. 위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한 나는 일본의 경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 일본의 미국배우기
일본은 패전 후 어떻게 일어섰나?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받고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원자탄을 맞은 일본국민의 처참함은 그야말로 참담했다. 한동안 대대로 물려온 방사능 증후군, 우리나라 주사파족 같았으면 지금까지도 미국을 증오만 하고 찜짜나 붙으면서 살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사무라이 정신 때문인지 강자에 솔직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래, 미국이 일본보다 잘났다. 잘난 미국 한번 배워보자” 깃발을 든 인솔자를 따라 너도 나도 미국으로 갔다. 공장 앞에 일본인들이 줄을 서서 공장을 보여달라고 졸랐다. “저 코가 납작한 JAP들 왜 저래?”, “예, 공장구경 좀 시켜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래, 보여주고 얼른 보내버려. 저 사람들 아무리 해도 미국 근처에도 못 와.” 일본인들은 굴욕을 무릅쓰고 열심히 공장을 견학했다.
소니의 공동창설자 아키오 모리타가 1955년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었다. 원래 라디오는 미국의 TI(Texas Instrument)사가 만들었다. 진공관 라디오라서 가구처럼 컸고 스피커 소리가 웅장했다. 트랜지스터는 1948년 ‘벨(Bell)’연구소에서 발명했다. 아키오 모리타는 벨 연구소를 찾아가 트랜지스터 사용권을 사겠다고 했다. 용도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모리타씨는 라디오를 만들겠다고 했다. 손바닥 안에 쥐어지는 작은 물건에서 무슨 소리가 나겠냐며 비웃으면서, 그거라면 얼마든지 거저 사용하라고 했다.
SONY 신화의 탄생
1995년 모리타는 트랜지스터라디오를 팔려고 미국에 갔다.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시큰둥했다. 물건 같지도 않게 생긴데다 미국에서는 Made in USA에 아니면 쓰레기 취급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 이른바 NIH증후군(Not Invented Here Syndrome) 즉 “이거 미제 아니잖아?” 이것이었다. 판로가 막힌 모리타는 3일 동안 궁리한 끝에 묘수를 찾아냈다. 신문광고였다. 고객이 백화점에 요구하니 바이어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신문광고의 효시였다.
당시 시계제작사인 ‘불로바’ 중역이 모리타에게 접근했다. 50만개를 주문 할 테니 라디오에 불로바 마크를 부착해 달라고 했다. OEM으로 해 달라는 것이었다. 천막 회사에게는 엄청난 횡재였다. 모리타씨는 본국에 타전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본국에서는 마음변하기 전에 어서 OK하라고 답이 왔다. 그런데 모리타는 밤새 연구하여 자기 결단을 말해주었다. “OEM으로는 안합니다.” 불로바 중역이 깜짝 놀랐다. “당신, 불로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알지요?” “네, 잘 압니다. 유명한 회사이고 훌륭한 회사지요.” “그런데 당신네 회사는 이름도 없고 제품도 상품으로 제대로 인식돼 있지도 않은데,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불로바 마크가 붙으면 상품의 공신력이 올라 갈 텐데, 도대체 당신은 제정신인가요?”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불로바 회사도 50년 전에는 우리 SONY처럼 작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SONY사도 50년 후면 지금의 불로바 회사만큼 훌륭해 질 수 있을 겁니다. 라디오는 SONY이름으로만 판매합니다.” 이 후 30년도 안 되어 두 회사의 위상은 완전 역전되었다.
1957년,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일본에 왔다. 전승국 국수장관의 위력이 대단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 군중을 향해 덜레스는 실로 일본을 비하하는 연설을 했다. “친애하는 일본국민 여러분, 이 손수건을 보십시오.” 그는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흔들어 보였다. “일본 국민은 손수건과 파자마를 매우 훌륭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제품을 계속 만들려 하지 않습니까?” 손수건이나 계속 만들 것이지 무슨 라디오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느냐 비아냥거림이었다. 이 후 25년 만인 1982년, 미국은 미국 자동차 시장이 일본차로 가득 채워지는 수모를 당했던 것이다.
트랜지스터 시대에 이어 워크맨, 워크맨 시대에 이어 캠코더 시대를 열면서 SONY는 오디오와 영상 시장에서 왕좌에 오르게 됐다. 우리나라 방송장비는 모두 SONY로 채워져 있다.
데밍상 제정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무기와 군수품을 생산했다. 군수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통계학자 슈하르트가 1926년 벨연구소에서 ‘슈하르트 컨트롤 차트‘를 고안했다. 각 제조 단계에서 측정기를 가지고 수치를 측정해서 일정 범위 내에 있으면 통과 시키는 품질관리 요령이었다. 이는 Z-1 표준으로 불렸다. 맥아더는 일본의 모든 군납업체에 Z-1 표준을 강요했다. 한동안 Z-1표준을 사용하던 일본은 통계학자인 가오루이시카와 다구치 박사들의 등장으로 미국을 뛰어 넘었다.
미국식 품질관리는 마치 고속도로 경찰관처럼, 부품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불량품을 잡아내는 사후 품질관리이지만, 일본은 하자품이 생기기 전에 작업자와 Q•C(Quality Control)요원, 즉 품질관리 요원이 함께 공정을 연구하여 사전에 하자를 예방하자는 사전 품질관리를 정착시켰다. 미국으로부터 먼저 배운 후 미국을 능가하자는 것이 당시 일본 품질관리학자들의 철학이었다. ’Copy the worst, Catch up with the west’, 이것이 일본의 구호였다.
일본은 미국이 낳은 품질이론의 대가들을 1950년부터 모셔다 배웠다. 세계적 인물인 데밍 박사, 쥬란박사, 피겐바움 박사, 그 중에 일본인들은 데밍 박사를 가장 좋아했다. “모든 의사결정은 통계자료에 의해 하라. 통계자료 없이 하는 의사결정권은 오로지 신에게 있다,
1951년 일본은 ‘데밍상’(Deming Prize)을 제정했다. 이 후 데밍상은 비단 일본 기업에게만 주는 상이 아니라 세계 기업에도 주는 상이 됐다. 산업계의 노벨상인 것이다. 데밍상 수상업체는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었다. 화장품 제조업체 ‘코제’는 데밍상 수상업체다. 수백키로 떨어진 가게로부터 화장품 하나를 주문 받으면 영업 사원이 달려갔다. 배보다 배꼽이 커도 너무 큰 엄청난 비용을 감수했다. 하지만 한 번 갈 때 많은 제품을 견본으로 가져다 친절히 소개하고 설명했다.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은 비용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그 이상으로 컸다. 미국과 한국 기업은 단기 이윤과 장부에 기록되는 숫자를 보지만 일본 기업은 1950년부터 사과나무를 심었다.
또 다른 데밍상 수상업체인 ‘이나타일’은 수학적 이론을 도입하여 품질을 향상시켰다. 건물의 마감재로 쓰이는 네모난 타일, 뜨거운 가마(로)에서 가열된다. 기다란 ‘로’의 불길을 아무리 균등하게 하려 노력을 해도 제품 규격이 들쑥날쑥 했다. 당시의 기술자, 경험자들은 ‘규격이 일정하려면’ ‘로’ 곳곳의 온도가 균일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했다. 따라서 타일의 규격은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했다. 여기까지가 기술자와 경험자들의 한계였다.
그런데 젊은 수학도가 나타났다. 타일의 성분이 7가지였다. Y=AX1+BX2•••FX7 이었다. 수학 도는 편미분을 생각했다. 6가지 요소는 동결하고 한 개 재료의 양을 변동시켜가면서 타일을 구워보았다. 결론적으로 석회의 양을 현재보다 8% 늘려서 구웠더니 불길의 강도에 관계없이 크기가 일정했다. 이것이 사전 품질관리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원자탄으로 멸망시키려 했던 나라로부터 스승을 초청하고 그 나라 사람의 이름을 따서 ‘데밍상’을 제정 했겠는가? 일본이 미국을 배워 미국을 능가하듯이, 우리 한국인들도 제발 과학적 사고 방식을 가졌으면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