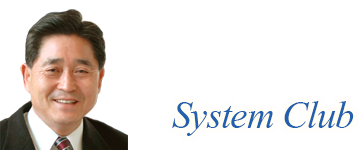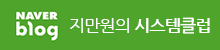<신문 논단> 그들은 진정 학생인권을 원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0-01-06 00:02 조회3,897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2010/01/01 신문 9면 게재
<논단> 그들은 진정 학생인권을 원하는가
아동인권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져온 필자는 제법 두툼한 관련 저서도 출간한 바 있고, 또 연구보고서와 적지 않은 발표문도 가지고 있다. 유학 당시 지도교수님의 주된 관심이 아동의 권리(Children's Rights)였으며 같은 제목의 저서도 갖고 계신 인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동안 이 분야의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내지 않은 사연은 무슨 주장이든지 ‘권리’ 또는 ‘인권’을 붙여서 주장하는 그릇된 세태에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자책감 때문이었다. 이러한 우려가 이번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교육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봄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감의 주도 아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세우고,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2월에는 그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해 오는 2월 초 조례안을 확정한다고 한다. 학생들의 인권 개선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학생인권 증진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게 되고, 인권 개선 자체가 사회의 선진화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예컨대, 초안 제6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7조에 나와 있는 체벌과 집단괴롭힘(왕따) 금지 조항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경기교육청이 발표한 초안을 보면, 선뜻 수긍이 가질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미 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필자는 정치적 보-혁(保-革) 대결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 자체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경기교육청이 발표한 48개항을 모두 검토하기보다는 몇 가지만을 살펴보자.
맨 먼저, 무슨 주장이나 ‘권리’를 붙여 내세운다고 해서 성립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권리이론이 바로 권리실증주의이다. 권리실증주의 핵심인 즉, 과도한 권리주장을 막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초안 제16조와 제17조에 명기한 사상·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문제는 과도한 요구사항처럼 판단된다.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조항이다.
물론 헌법에 없다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모든 권리가 성립된다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빨치산 교육을 합리화하는 권리로 둔갑시킨다면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초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교육상황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제12조에서 제15조의 내용은 ‘학교’의 본질이 망각된 조항으로 보인다. 노동법의 노동자의 권리는 기업의 본질과 사업장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권리는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학교는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제13조4항은 학교가 사회계약론의 자연상태처럼 방임상태의 장소가 아니라 교수-학습을 위한 통제가 허용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간과해 버렸다.
또한 제10조에 명시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안 되고, 그 선택이 학생들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학생들이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원리상 동의할 수 있으나, 교육의 실행과정에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의 권리가 무시돼 버렸다.
제28조 내지 제32조의 인권교육 조항도 국민권리설을 무시한 채, 국가권리설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국가가 그 범주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항해 성립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그 범주와 속성을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과도한 권리주장을 담은 경기교육청의 초안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권리로 성립하는 데도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권리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수반하는 것이라는 점이 원천적으로 경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봄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감의 주도 아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세우고,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2월에는 그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해 오는 2월 초 조례안을 확정한다고 한다. 학생들의 인권 개선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학생인권 증진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게 되고, 인권 개선 자체가 사회의 선진화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예컨대, 초안 제6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7조에 나와 있는 체벌과 집단괴롭힘(왕따) 금지 조항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경기교육청이 발표한 초안을 보면, 선뜻 수긍이 가질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미 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필자는 정치적 보-혁(保-革) 대결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 자체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경기교육청이 발표한 48개항을 모두 검토하기보다는 몇 가지만을 살펴보자.
맨 먼저, 무슨 주장이나 ‘권리’를 붙여 내세운다고 해서 성립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권리이론이 바로 권리실증주의이다. 권리실증주의 핵심인 즉, 과도한 권리주장을 막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초안 제16조와 제17조에 명기한 사상·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문제는 과도한 요구사항처럼 판단된다.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조항이다.
물론 헌법에 없다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모든 권리가 성립된다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빨치산 교육을 합리화하는 권리로 둔갑시킨다면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초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교육상황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제12조에서 제15조의 내용은 ‘학교’의 본질이 망각된 조항으로 보인다. 노동법의 노동자의 권리는 기업의 본질과 사업장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권리는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학교는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제13조4항은 학교가 사회계약론의 자연상태처럼 방임상태의 장소가 아니라 교수-학습을 위한 통제가 허용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간과해 버렸다.
또한 제10조에 명시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안 되고, 그 선택이 학생들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학생들이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원리상 동의할 수 있으나, 교육의 실행과정에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의 권리가 무시돼 버렸다.
제28조 내지 제32조의 인권교육 조항도 국민권리설을 무시한 채, 국가권리설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국가가 그 범주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항해 성립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그 범주와 속성을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과도한 권리주장을 담은 경기교육청의 초안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권리로 성립하는 데도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권리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수반하는 것이라는 점이 원천적으로 경시돼 있기 때문이다.
|
댓글목록
이강현님의 댓글
이강현 작성일
그 잘난 인권가지고 뭘 하겠어요?????
다들 학생들을 돌밭을 만들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같은 데.....
잔 대가리 굴리는 걸 보면 저런 학교에는 제 후손들을 절대로 다니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