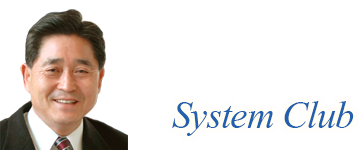드디어 638고지를 탈환하다[1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케 작성일12-05-06 00:14 조회6,70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드디어 638고지를 탈환하다
1972년 4월 23일 초저녁,
수색 중대원들은 퇴각한 월맹군들이 밤을 이용해 다시 반격해 올까 봐 마음 졸이고 있었다. 불안하고 초조하였다.
애간장이 다 녹아버릴 것 같은 심정이었다.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캄캄한 전선의 밤이다.
이 시커먼 먹구름이 전선의 밤을 다 삼켜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만 장막을 치고 있는 전선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그 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앞을 주시하였다.
위쪽에 위치한 중대장이 있는 곳에서는 가끔씩 들려오는 “쒜~쒜~”하는 무전기 키 잡는 소리가 고요한 전선의 밤의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다.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이름 모를 풀벌레 우는 소리에 잠시나마 그리운 고국의 향수에 젖어 들기도 했다.
내일이면 처절하고 치열했던 이 지루한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들은 불안하고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은 안정이 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4월11일 새벽에 제1중대 소도산 전술기지에 세이 파(특공대) 작전으로 침투해 왔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세이 파(특공대)작전으로 침투해 올까봐 수색 중대원들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잔뜩 긴장을 하였다.
약 20-30m전방에 있는 적의 벙커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다.
“모두들 단단히 각오를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전, 한국으로 철수준비 관계로 저 두 곳의 벙커에 경계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때문에,
천혜의 요새와 같은 이 고지를 적들에게 무단으로 점령당하고 말았다.
그 때의 악몽이 떠올랐다.
전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은 한 번 저지른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도 또다시 이 638고지를 적들에게 빼앗기는 전철을 밟는다면!”
이 전쟁은 영원히 역사의 오욕으로 기록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경계에 임하였다.
제 4중대가 적들의 벙커 뒤쪽에서 공격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들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적들의 벙커 뒤쪽에서 공격해 온다던 제4중대는 새벽 05시가 지나가고 06시가 다 지나가도 감감 무소식이었다.
또다시 동쪽 하늘의 먹구름 속에서 여명이 걷히고 아침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한편!
이무표 중위가 이끄는 제4중대 특공대는 밤, 시간대에 제1중대 소도산 전술기지를 출발하였다.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제1중대 소속 박 태 균 하사의 길 안내를 받았다.
그 들은 4월24일 06시 경에 638고지 뒤쪽 후사면 8부 능선에 무사히 도착했다.
“돌격 예상지점에 도착하였다!”
공격 시기를 포착하기 위해 적정을 살폈다.
주변 지형지물과 적정을 유심히 살피고 있을 때였다.
이때였다.
고지정상에서 적병 2~ 3명이 후사면 쪽으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제 4중대 특공대원들과 특공대장 이무표 중위는 이제 고지에는 적들이 다 도망치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감지하였다.
이에 힘을 얻은 이무표 중위는 지체하지 않고 특공대원과 함께 돌격을 감행하였다.
특공대원 모두 비호처럼 정상을 향하여 치달았다.
수류탄 투척거리까지 접근한 이무표 중위가 이끄는 특공대원 3명이 적들의 벙커 뒤쪽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그 들은 도주하고 아무도 없는 적들의 벙커를 향해 수류탄을 투척하는 모습이 보였다.
첫 발은 불발탄이었다.
두 번째 투척한 수류탄이 적들의 벙커 속으로 굴러 들어갔다.
“과~꽝!~”
폭발소리가 통쾌하게 들려왔다.
“과~꽝!~과~광!~”
연속적으로 2-3발이 명중되는 소리와 함께 뒤쪽에 있던 이무표 중위가 지휘하는 제4중대 특공대원들이 벙커 쪽으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이때였다!
벙커 정면에서 적 벙커와 약 20-30m정도 거리에 있던 기갑연대 수색 중대원들도 살판이나 난 듯이
“와!~아~”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참호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그 들은 적들이 은폐해 있었던 벙커위에서 조우하였다.
제4중대 특공대 전우들과 서로 얼싸안고 조우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했다.
기쁨의 순간을 접고 냉정을 되찾았을 때였다.
오는 뒷맛이 이상야릇했다.
그토록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이던 638고지를 이렇게 탈환하였다.
이 고지 정상에 서기 까지 죽어간 전우들이 얼마이었던가?
그 거룩한 죽음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단 말인가?
또, 그동안 쏟아 부은 물량이 얼마이었던가?
“마지막 공격의 순간에 적들은 그 틈을 용하게도 피해 도망쳤다!”
결국은 아무도 없는 텅 빈 벙커에 돌격을 감행한 셈이다.
그 넌덜머리나도록 애간장을 태웠던 놈들은 흔적도 없이 모두 도망치고 말았다.
마치!
쥐새끼처럼 도망치고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확인하게 되자,
조롱을 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몇 놈이라도 생포하여 그 악랄한 꼬락서니를 꼭 한 번 보고 싶었다.
그런데, 허탈감에 맥이 확 풀렸다.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꼴’ 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이 그 들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어차피 생과 사를 겨루는 전쟁이라는 속성으로 볼 때,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소의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치른 희생과 흘린 땀에 비하면 허망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그 순간까지도 월맹군들이 있었던 벙커 속에서는 수류탄의 메케한 화약 냄새와 함께 연기가 모락모락 피워 오르고 있었다.
- 계속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