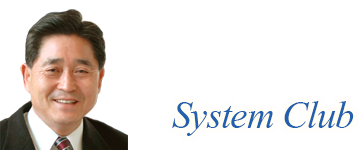나의산책세계 영문(운명을 열어준 낯선 소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12-30 22:45 조회7,78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운명을 열어준 낯선 소령
1961년 늦가을 오후, 경복궁 옆에 있었던 당시 육군병원에서는 육사 수험생들에 대한 신체검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검사장 밖에는 빛바랜 나무 스탠드가 단풍진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딱딱하게 다져진 흰색 흙바닥에는 오그라진 단풍잎들이 스산한 가을바람에 밀려 이리 저리 굴러다니고 있었다. 사관 지망생들은 스탠드의 이곳저곳에 옷을 벗어 소복하게 쌓아놓고 팬티와 맨발 차림으로 우중충하고 한기 도는 붉은 벽돌 속으로 밀려들어갔다. 온몸에 솜털이 곤두설 만큼 쌀쌀하긴 했지만 긴장감 때문인지 이를 내색하는 녀석은 없었다.
나의 키는 재보기에 따라 어떤 때는 합격선을 2∼3㎜ 초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만큼 미달되기도 하는 실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마루기둥에 눈금을 그려놓고 갓 시집온 셋째 형수에게 삼각자를 맡기고 잘 재보라고 당부하지만 모자랄 때가 더 많았다. 빼고 보탬 없이 수치만 달랑 읽어주는 형수가 때로는 무정하고 얄밉기까지 했다. 그 정도 모자라는 키는 정수리를 각목으로 여러 번 때려서 순간적으로 부어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정리한 후, 나는 입시준비에만 열중했다. 신체검사 전날! 연습 삼아 각목으로 머리를 살살 때려봤지만 딱딱한 두개골은 탱탱 소리만 내고 아프기만 했다. 머리가 빳빳하게 서면 다소 유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동네 이발소에 가서 짧은 스포츠형 머리를 ‘고대기’로 높여 하이칼라로 해달라고 했다.
모든 검사에서 하나씩 합격을 해가면서도 신경은 온통 신장계 쪽에만 쏠렸다. 드디어 피를 말리는 순간이 왔다. 키를 재는 하사관이 염라대왕 같이 느껴지는 순간. 여지없이 “불합격!”을 외치면서 신체검사 용지에 도장을 찍어버렸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멍해졌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내 허무했다. 조건반사적으로 밖으로 나와 옷을 주워 입긴 했지만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턱을 괴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텅 비어 보였다. 그 텅 빈 하늘처럼 나의 앞길도 막막해 보였다.
내가 육사를 동경하게 된 것은 10살 때부터였다. 6⋅25전쟁이 소강상태에 빠져있을 때 동네 형들이 휴가를 나왔다. 나의 큰 형이 나보다 16살이나 위였기 때문에 형들이라 부르긴 하지만 군인아저씨들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육사의 존재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 내가 살던 마을은 검푸른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뒤늦게 떠오르는 태양은 마을 뒷산 위에 조금만 머물다가 이내 서쪽 산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산들이 검게 변하는 순간부터 사방에서 음산한 기운을 쏟아내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
동네 형들은 동네를 지나는 타동네 사람들에게 텃세를 하느라 곧잘 싸웠다. 그때마다 형들은 파출소에 끌려가 순경들로부터 따귀를 맞곤 했다. 이제는 그 형들이 총과 실탄을 가지고 휴가를 나와 순경들을 때렸다. 군인이 최고로 높아 보였다. 형들은 깊은 물속으로 총을 신나게 쏘아댔다. 연발로 발사되는 탄환들! 팡, 팡, 팡 팡, 팡이야~ 예광탄이 빨간 줄을 그으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와 긴 선을 그리면서 먼 산으로 날아갔다. 축 늘어진 한복 바지를 돌돌 말아 입고 다니던 꼬마들의 입이 다물어질 줄 몰랐다. 날씬한 피라미, 듬직한 불거지들이 은빛과 붉은 빛을 반짝이면서 떼를 지어 물위로 떠올랐다. “야~!” 군인 형들이 여간 우러러 뵈는 게 아니었다.
마을 아주머니들은 무쇠 솥뚜껑을 화로 위에 뒤집어놓고 그 위에 메밀 적을 부쳐 형들에게 대접했다. 집에서 담근 밀주도 나왔다. 텃밭에 묻어둔 싹 난 무를 싸리나무 꼬챙이로 꺼내오기도 했다. 형들의 영웅적인 전쟁 이야기와 배꼽 빼는 군대 이야기들에 정신이 팔려 자꾸만 더 해달라고 채근했다. 처녀들은 윗방에 작은 상을 차려놓고 날고구마를 깎아 먹으면서 종이 문 뒤에 귀를 모았다. 누나들의 소곤거리는 소리와 시시덕거리는 소리를 훔쳐들은 형들은 더욱 목청을 돋우어 보태고 튀겨가며 무용담을 자랑했다. 그들의 무용담 속에는 가끔씩 ‘사관학교 출신’들에 대한 경의가 배어있었다.
“형, 사관학교가 뭐야?”
“응, 장교들 중에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 부대에서 쌀과 고기를 훔쳐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들은 실력도 많고, 원리원칙대로 지휘를 해서 존경을 받는단다. 육사출신들, 참으로 훌륭하고 멋지더라. 너도 이다음에 공부 잘해서 육사를 가렴. 너는 총명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을 거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시험을 보면 되는 거란다.”
사관학교에 대한 꿈은 이렇게 해서 길러지기 시작했다. 이 오랜 꿈이 방금 전, 한 하사관에 의해 좌절돼 버린 것이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어머니가 생각났다. 아버지는 내가 열일곱 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나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 없었다. 어머니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일은 막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하는 것뿐이었다. 시루떡을 해 가지고 꼭두새벽에 산에 올라가 치성을 드리고, 날마다 우물가에 정화수를 떠놓고 축원을 했다. 어머니는 나를 47세에 낳았고, 그때 아버지는 53세였다. 늦둥이로 태어나니 귀여움은 한 몸에 다 받았지만 기골이 약해 늘 배앓이를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를 업고 개울 건너에 사는 침 할머니에게 자주 다녔다.
여섯 살 되던 해의 어느 추운 겨울, 밖에는 발목을 덮을 만큼 흰 눈이 내려 있었다. 아침상에는 노란 좁쌀 밥과 짠 김치, 물김치 그리고 구수한 숭늉이 올라 있었다. 뚫어진 문풍지 사이로 뽀얀 햇살이 들어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좁쌀 밥 위를 평화롭게 비췄다. 바로 위에 누나는 열 살, 그 위의 형들은 각기 열세 살과 열여섯 살이어서 의젓하지를 못했다. 한참 먹을 나이라 그들은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밥을 먹어치우고는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궁둥이에 손을 대고 입으로 방귀소리를 그럴 듯하게 낸 후 그 거무튀튀하고 투박한 손을 나의 밥그릇 위에 갖다 덮었다. 입에서 오돌거리는 조밥이 못마땅한 터라 나는 숟가락을 집어 내던지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형들에게 애 성미를 잘 알면서 그런다며 나를 달래기 시작했다. 그치지 않자 어머니는 밥그릇을 가지고 부엌으로 나갔다가 다시 가져와서는 새 밥으로 바꿔왔으니 어서 먹으라고 했다. 나는 밥을 검사해 보고는 엄마가 속였다며 더 신경질을 냈다.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부엌에서 커다란 바가지를 가져다가 물을 잔득 부어 가지고 내가 보는 앞에서 조밥을 씻었다. 방귀가 깨끗이 씻어졌으니 이제 먹으라는 것이었다. 김치 쪽을 물에 씻어 얹어주며 언제 폭발할지 모를 나를 살얼음처럼 다루면서 밥을 먹여주었다.
일곱 살이 되자 그 개구졌던 바로 위의 형이 나를 초등학교에 업어다 입학을 시켰다. 말이 일곱 살이지 생일이 12월 말인 나는 여섯 살에 불과했다. 아침마다 그 넷째 형과 어머니가 번갈아가며 나를 학교에 업어다 주었다. 반에는 장가를 간 학생들도 있었다. 나는 전교에서 가장 어렸지만 1학년 때 선생님은 전교 학예회에서 내게 주연 연기를 두 개나 시켰다. 학예회에서 나는 나보다 덩치 큰 아들을 둔 할아버지의 역할을 했다. “똘똘이 할아범”, 내가 살던 고을에서 나는 이렇게 불렸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등에 찼던 책보를 쪽마루에 내팽개치고 허리에까지 축 늘어진 어머니의 젖부터 찾았다. 부엌에 계시든 밭에 계시든 관계없이 나는 젖꼭지를 손으로 두어 번 문지르고서는 짠 내를 즐겼다. 근력이 딸리시는 어머니는 기다란 담뱃대에서 쓰디쓴 댓진을 꺼내 젖꼭지에 바르겠다고도 했고, 학질에 먹는 금계랍이라는 쓴 약을 바르겠다고 위협하지만 나의 능청에는 당해낼 도리가 없다며 기권하셨다.
열네 살 때, 형들은 나에게 괭이를 들려 땅을 파게 했지만 몇 번 땅을 찍기가 무섭게 물집이 생겼다.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네 형들이 방학을 끝내고 올라갈 때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어머니에게 용돈을 마련해 달라고 졸랐다. 어머니는 “머리를 잘라서라도 용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며칠씩이나 깊은 산에 올라가 산나물을 뜯어다 쌓았다. 그리고 5일장에 가지고 나가 용돈을 마련해 주셨다.
나는 그 돈으로 차표를 사기가 아까워 무임승차를 했다. 팔뚝에 검붉은 완장을 찬 검표원이 염라대왕같이 무서웠다. 순간적인 꾀로 아슬아슬하게 피하긴 했지만 가슴은 방망이질을 했다. 청량리역에 도착했다. 형들이 일러준 대로 석탄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쪽으로 숨어 들어가 철조망에 뚫린 구멍으로 빠져 나왔다. 빠져 나와서도 한동안 뒤를 돌아봤다. ‘야, 이놈, 너 이리 좀 와봐’ 하며 역무원이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만 같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 결 같이 공부에 집착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사관생도의 멋진 이미지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먹고 자는 문제는 물론 학비까지도 해결된다는 형들의 말 때문이었다. 가난한 내게 이런 학교는 정말로 꿈의 학교였다.
그런데 불합격이 웬 말인가!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났다. 지금도 시골에서 나를 위해 치성을 드리고 계실 모습이 상상되자 가슴이 북받쳐 올랐다. 주르륵! 뜨거운 물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다. ‘맞아! 죽더라도 싸워나 보고 죽어야 해. 참새도 죽을 때는 그냥 죽지 않고 짹 소리라도 내고 죽는다잖아!’ 오기가 솟아났다. 두 주먹에 힘이 생겼다. 아플 만큼 아래 입술을 깨물었다. 옷을 입은 채, 키 재는 하사관에게 다가가 키를 다시 한 번 재달라고 말했다. 그의 눈이 사납게 찢어졌다. 서류를 정리하고 외박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난 것이다.
“사람의 키라는 건 재보기에 따라 몇 밀리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쩨쩨하게 그만한 키 차이로 훌륭한 장교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육사를 얼마나 동경해왔는지 아세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들이댔다. 그는 화를 내며 사관학교 신체검사가 장난인줄 아느냐고 했다. 이 이상한 말싸움 장면에, 정말로 잘 생긴 미남 소령 한 분이 나타났다. 팔뚝에 심판관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었다. 그는 하사관 이야기와 내 이야기를 번갈아 들었다. 나는 소령에게 합격만 시켜주시면 육사에 들어가 부족한 키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분은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요놈 봐라, 그래, 네 말이 옳다.” 하며 하사관에게 키를 다시 재라고 명령했다. 구두를 벗고 올라서려 하자 그분은 구두를 신고 올라서라 했다. 신체검사 용지에 내 키는 상당히 넉넉한 키로 기록되고 그 소령은 정정란에 그의 도장을 힘 있게 눌러 주었다.
The season of striving
In 1961, after finishing my evening class of Hanyōng High, I applied for a Mathematics cours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ut failed the entrance exam. Although I had worked for a living and studied so hard at the same time, got embarrassed by the challenge of a place in SNU. I was, in fact, desolate and bereft for a living, food and bed as a drifter let alone a university challenger. This time again, Ch’angdae who was a cosmetic pedlar found me a living-in tutoring job, like he had done before. The student was in his third year of an Education College High School, a second son of a city counsellor in Sindang-dong. He questioned me in the basics of mathematics a lot. I first thought that they were rather trifling questions but, in fact, they helped in summarising my own study by answering his questions.
My student passed his entrance exam for the Engineering facul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o did I for the Korean Military Academy. KMA was the place where my real education started as I almost had a self-study depending on a few months of evening classes in middle/ high school. Whether my self-study contributed, I was good and quick at Maths, Physics, Electricity, Dynamics, Civil engineering etc. which were relatively easier for me than other subjects. In math and scientific subjects, I usually worked on main texts and some exercises but maintained in top ranks of the class. When others were spending long hours to solve as many as problems I, instead, read classics, biographies of great men and women, hero/ine stories and the magazines about the realm of thoughts etc.
- A colonel, a stranger who altered my destiny
Before the written exam, all the KMA candidates had to go through preliminary physical examination first. It was a late autumnal afternoon in 1961, I entered the Army hospital which was then next to Kyōngbok-gung/ palace. Outside the building, a number of discoloured wooden seats were surrounded by trees with fall foliage and the autumnal air was stirring up the fallen leaves on the solid white ground. We left our clothing on the seats and entered the red brick building which looked quite dismal. It was cold enough to give us goose bumps as we were in our underpants only though no-one really showed any worry as everyone was so tensed up.
There was minimum height requirement and mine was 2-3mm marginal on the line which depended on how it was measured. For the last few days, all I thought about was my height. At my third oldest brother’s, I marked scale length on a lounge pillar and asked my sister-in-law who just got married to measure me accurately fail. She measured me several times with a large set square then read out the digits which weren’t quite enough. Although she told me exactly what were shown on the scale but I felt a bit cross with her who sounded so callous. I thought that I could swell the crown of my head a bit by hitting with a piece of lumber and concentrated on studying for the written examination. On the day before the physical examination, I attempted to hit the top of my head with a piece of wood but it made a banging sound and was quite painful. I took the next option when I went to my local barber shop and asked to build my hair high and tufty as possible.
When I was going through all other sessions which were ‘pass’ though the height inspection kept bugging me throughout when it arrived. The inspector looked like a Grim Reaper who gave me a flat refusal ‘fail’ and stamped on the paper. I was stunned, ashamed of myself and felt totally blank. I came out and got dressed but couldn’t just walk away. I sat down, put my hands on my chin and looked up at the sky which looked so empty as well as my uncertain future.
When the Korean war came to a lull, I was ten years old. Some of the old boys from my village went to the war as soldiers came back for leave. My village was screened by dark green mountains. The sun came up late, didn’t stay long then, sunk to the west of mountain. As soon as the sun set, the village turned jet black and spooky all around. The old boys were not that tolerant to outsiders who were just passing by. They were targeted by our boys who caused trouble, frequently landed in the police station and got slapped. The tables were turned. The boys returned the village with rifle and bullets and beat the police. Then, soldiers were the masters as if they were above the law. They fired their rifles into deep water at their will. I saw one of their magazine rifles spewed the bullets out. P-taff, p-taff, p-taff, p-taff, p-taff… tracer bullets flew out, drawing red streaks, went in and out of the water then carried and disappeared into the remote mountain. A school of Small ricefish and glowing Minnows in red and silver surfaced of the water. We little boys in baggy trousers were watching it and our mouths were wide open in amazement. “Wow!”, the soldier boys just looked so great. The village women made buckwheat pancakes for the soldiers. They first turned over the lid of a caldron which was put on brazier and cooked on it. The soldiers were treated to the pancakes with home made wine and some pickled radish which had been taken out of the vegetable garden. The soldiers told us how heroically they fought in the war and what the military life was like combined with all the fables. Then, they mentioned the Korea Military Academy with a respect, at times. “What is the KMA?”, I asked. One of the soldiers answered. “There were many officers in the ranks from different backgrounds. Many of them were just taking advantage of their position by taking soldiers food away, for example. But these KMA officers were different and so cool. They were so knowledgeable and conducted us in the principles that made us respect them. Man-won, you study hard and make your way to the KMA. You can make it as you are so bright. But you must finish High School first then take an exam for the KMA”.
That was how my KMA dream had journeyed which appeared to be over by the sergeant inspector’s a decisive call “fail” a few seconds ago. “How can I go on living from now on?” Then, I remembered my mother. After my father died when I was seventeen my mother had nothing to offer me but praying. Every dawn, she went up to the hill with rice cake and put a fine glass of water at the well and prayed to God. I was born when she was 47 and my father was 53. As a baby of the family, I was growing up with all their love but suffering stomach trouble. They frequently took me on a piggyback to an acupuncturist who was an old lady and living across the stream. On a wintry day when I was six, the snow came down to ankle depth. One morning, on our breakfast table, there was cooked yellow millet, kimchi/ vegetable pickles and warm tea. A ray of sun came through a hole in the paper door and shone on the steamy cooked millet which looked so peaceful. My sister was ten and older brothers who were thirteen and sixteen respectively. My brothers were playful and had massive appetite, finished their meals first. Then, my thirteen year old brother put his hand on his backside and made a sound of breaking wind with his mouth then, gathered his rough hands over my bowl. I wasn’t even enjoying the cooked millet that had coarse and fibrous touch in my mouth, really put me off by my brother’s gross action. I just threw my spoon away and flounced out myself. My mother told the others off then, began to mollify me but I wouldn’t stop. She took my bowl to the kitchen and came back saying it was fresh one. I looked at it and found that it wasn’t fresh so, I got angry once more, saying, mom told me a lie. She then, brought a jug of water and rinsed the millet in front of me then told me to eat as it had been well washed. She fed me so gingerly in case my temper went off again.
I started school when I was full six as my birthday was at the end of December. On my first day of school, my brother who was mischievous and played by the breaking of wind took me to the school on his back. Since the first day, my mother or he took me to the school and back in turns on their backs. It was funny old days when some class mates were married already. Although I was the youngest, my class teacher gave me two main parts in school plays on my first year alone. Once I played a grandpa who had a son who was much bigger than me and my villagers began to call me a ‘Ttolttori’/ bright one after that show. However bright they thought me, as soon as I came back home from school, threw my school bag on the floor and sought for my mom’s breastfeeding. Whatever she was doing, I clung on her, rubbed her nipples a couple of times with my finger and enjoyed the salty milk. As she was ageing, wanted to stop breastfeeding and tried some tricks. She warned me she would apply nicotine from the tobacco pipe or Kūmgyerab/ the bitter malaria tablet on her nipples but gave in to my unmoving demands.
There were two main reasons how I had been able to concentrate on studying all those years under the hardship. First, it was the cool image of the KMA cadet and second, more importantly, free of living and academy fee which was an ideal dream for me who was penniless. But the sergeant’s decrying “fail” message. What about my mother who was even right now praying for me at back home. The thought of this made my eyes well up and my heart bled. “OK, I cannot give in now, it is said that even a sparrow makes a final tweet under the trap”, I felt a surge of challenge. I clenched my two fists and bit my bottom lip and approached the sergeant inspector. “Would you please measure my height once again?” His eyebrows raised sharply by my unexpected request. Apparently, he was about to leave for the weekend break. I elaborated. “My height might be a few millimetres shorter than the standard which couldn’t rule out the quality of being a good officer. Have you got any idea how much I’ve dreamt about joining the KMA for all my life? How would you feel if you were me?” The sergeant challenged me back, “is this whole process a joke to you?” Then, a very handsome major who was wearing an arm band with the word ‘Judge’ appeared and intervened in this unusual dispute. He then listened to us in turns. I told him if he would accept me I would make it up to the KMA with some of my other qualities instead of my short height. He gazed at me intensely for a while and said, “what a chap! You’re right”. He asked the sergeant to measure me again. When I was taking my shoes off he said, “no need, keep them on” and my height was just enough to be accepted. The major stamped “pass” on the correction box very firmly.
2017.12.30. Jee, Man Wo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