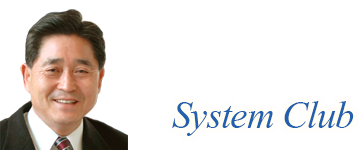5.18 임 윤상원과 이태복의 학림사건 내막 (만토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6-04-01 17:22 조회5,84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5.18의 임 윤상원과 이태복의 학림사건
1. 2012년 대법원의 또 다른 인민재판 “학림사건 판결”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學林) 사건'에 연루돼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투옥됐던 피해자들이 31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학림 사건 피해자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1도730)에서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한 원심을 6월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 때문에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검사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며 "이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12와 광주민주화 운동을 전후해 신군부에 의해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해당하고 이 전 장관 등의 계엄법 위반은 이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한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 중략 –
이 전 장관 등은 노동학생운동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19~44일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수사관들에게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전원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6월 학림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정하고 재심을 권고했다. 학림이란 명칭은 전국민주학생연맹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진 데 착안해 경찰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법률신문. 2012. 6. 15.)
2. 미국인 기자 Bradley Martin이 밝혀 놓은 학림사건의 내막
미국 “더 볼티모어 선 (The Baltimore Sun)” 지의 5.18 당시 서울주재 기자는 브래들리 마틴(Bradley Martin)이었는데, 그가 1993년에 학림사건의 주모자 이태복으로부터 들었던 증언을 지난 2000년 “동지들의 눈에 비친 윤상원(Yun Sang Won: The Knowledge in Those Eyes)”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다. 이 증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1980년 5월15일의 “서울역 회군”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시위대는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각기 생각이 달랐다. 이태복의 집단은 방송국 등 서울 중심부의 주요 지점들을 점거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5월16일 시위를 취소하고 정부의 반응을 보기로 했다. ‘윤상원씨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서울에서의 패배를 격렬하게 비판하였다’고 이태복은 나에게 말해 주었다. 이렇듯 이태복과 윤상원의 조직들은 광주사태로 치닫는 주요사건들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 (Martin 2000, 98)
“The demonstrators differed on what to do next. Lee Tae Bok’s group wanted to occupy key points in the central area such as broadcasting offices. The majority, however, decides to call off the demonstrations on May 16 and wait to see the Government’s response. ‘Mr. Yun, when he heard of this, vehemently criticized the defeat in Seoul,’ Lee Tae Bok told me. Lee and Yun’s organization thus was deeply involved in key events leading up to the Kwangju incident itself.” (Martin 2000, 98)
“이태복 집단”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른바 “전민노련” 그 방계 조직인 “전민학련”이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들에 대해 브래들리 기자는 또 이렇게 설명해 놓았다.
“1979년 중반에 윤상원은 ‘전민노련’ 광주지부 조직책이 되었으며, 1978년에는 ‘전민노련’ 방계조직인 ‘전민학련’ 조직책이 되었다. 윤상원이 1979년에 ‘전민노련’에 가입할 때 윤상원의 자격을 확정하기 위해 이태복 본인이 그와 면담했다. 윤상원과 이태복은 이 두 조직에서 동지가 되었다. 훗날 학림사건 때 경찰은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의 총칭으로 ‘학림’이라고 불렀다.” (Martin 2000, 97)
“(In mid-1979 Yun became an organizer in the Kwangju area for the National Democratic Worker’s League, Conminnoryon, its affiliated organization, the National Democratic Student’s League, Chonminhakryon, in 1978. When Yun joined in 1979, it was Lee who handled the interview to determine his qualifications. Yun and Lee became close comrades in the two organizations, which the police referred to collectively as ‘Haklim’(Student’s Forest).” (Martin 2000, 97)
학림사건을 파헤친 대공수사 전문가 이근안에 의해 밝혀진 이태복 등 24명의 전민노련과 전민학련 관련자들은 모두 5.18의 임이라고 불려지는 윤상원과 이어진 사람들이었다. 이태복은 그래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2년 대법원은 1997년의 5.18인민재판의 정신을 충실하게 이어받아, 학림사건 관련자들의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을 모두 묵살하고 전두환 등의 내란음모에 항거한 헌법수호세력으로 떠 받드는 악장 무너지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학림사건 관련자들의 범법행위는 2012년 대법원이 전두환 정부가 저질렀던 고문에 의한 수사로 몰아 원천무효화 했는데, 이태복 등 24명의 관련자들은 이상에서 미국인 기자에게 털어 놓았던 이태복의 증언에 의해 그들의 범죄행위가 모두 사실이었음을 자인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1997년 인민재판으로 완전히 사망했음을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이 어처구니 없는 반 대한민국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유일한 길은, 이제 5.18북한군개입을 밝혀 폭동반란의 역사를 만천하에 입증하는 것이다. 이상.
2016. 4. 1. 만토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