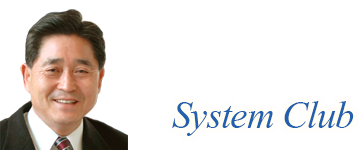기업경영 | 필자의 월남전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9 14:54 조회22,38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한국에서나 월남에서나 소총 사격장은 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안전지대에 설치돼 있다. 병사들이 사격을 하려면 거창하게 날을 잡아 부대 단위로 행군해 나가야 했다. 1개 분대가 사격을 하는 동안 나머지는 소위 PRI라고 하는 사격 자세 연습을 했다. 땡볕에 사격을 할 때에는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 사격장에서는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군기 잡는 얼차려가 당연한 과정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병사들은 사격하러 나간다는 말만 들어도 주눅이 들고 상을 찡그린다. 사격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각종 기합이 주어졌다. 사격점수를 정신점수로 착각하는 것이다. 정신이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사격점수가 좋지 않다는 신념하에 기합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신자세를 강조하는 식으로는 사격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
어떤 지휘관들은 무조건 많이 쏴봐야 한다며 훈련의 양을 강조한다. “실탄을 많이 쏘아봐야 해. 거기에는 못 당한다니까”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이들과는 달랐다. 필자는 불도저를 빌려다 영내 한쪽 끝에 사람 키만큼 깊은 도랑을 파서 25m 사격장을 만들었다. 사거리가 겨우 25m인 것이다. 파낸 흙은 표적(Target) 지점에 올려 쌓고, 병사들이 엎드리는 사격선에는 모래주머니를 깔고 지붕을 만들어 주었다. 이 사격장을 만드는 동안 바로 인접해 있는 보병 대대 참모들과 필자의 직속 상급대대 참모들이 제발 그만 두라고 성화를 했다. “감히 어떻게 영내에 사격장을 만들 생각을 다 하느냐”, “뭘 몰라서 저런다”, “사고가 나면 어쩔려고”. 하지만 이 사격장은 따분한 병영생활에 상당한 활력소가 됐다. 모든 분대가 매일 한 시간씩 사격을 했다. 무조건 많이 쏴봐야 한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다. 잘 쏘는 요령을 터득해야 했다. 사격의 요령이 무엇이냐에 대해 토의를 했다. 무조건 생각해 보라고 하면 착상을 하지 못한다. 마치 거북이 등을 뚫듯이 딱딱해 보이는 주제에 대해 실마리를 뚫어줘야 토의가 시작된다.
“사격을 잘 하려면 우리 무엇부터 따져봐야 할까?”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
“자세가 정확하고 숨을 멈추고 방아쇠 당길 때 조심하라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데?”
“왜 있지 않습니까. 애인 가슴을 만지듯 부드럽게 당기라는 것 말입니다.”
“야, 그건 방아쇠를 당길 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고. 방아쇠 당기기 전에 정확히 조준을 해야 하잖아.”
“조준부터 잘 해야지요.”
“어떻게 하면 잘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막혔다.
“야, 조준이라는 게 뭐냐. 조준 구멍을 통해 목표물을 조준대(가늠대) 위에 정확히 올려놓는 거, 그거 아냐?”
“맞습니다. 바로 그걸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하는 건데?”
여기에서 또 막혔다.
“조준구멍(가늠구멍)을 눈에 바짝 갖다 대면 구멍이 크게 보이냐 작게 보이냐?”
“크게 보입니다.”
“멀리 갖다 대면?”
“작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구멍을 크게 만들어 조준해야 정확하겠냐, 작게 만들어 조준하는 게 정확하겠냐?”
“구멍을 크게 해야 조준이 정확합니다.”
그제야 진수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야, 총과 몸이 30도 되게 하라는 식은 잊어버려. 가늠구멍을 눈동자에 더 가까이 갖다 댈 수 있도록 스스로 자세를 만들어 봐. 광대뼈가 나와 있으면 고개 꽤나 돌려야 할 걸”
병사들이 각기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폼을 개발하느라 열심이었다. 자신 있는 병사로부터 두 세 사람씩 가서 쏘았다. 하루에 9발만 주었다. 표적지에 각자의 이름을 쓰고 9발씩 쏜 후에 그 표적지를 분대별로 모아서 내 책상 위에 갖다 놓도록 했다. 명중도가 좋지 않은 표적지를 따로 뽑아내 놓고 표적지의 주인을 불러 모았다. 이들 중에는 제법 똘똘한 병사들이 많았다.
“너 왜 이렇게 막 쏘았냐? 눈이 안 좋으냐?”
“아닙니다. 눈도 좋고 신중하게 쏘았습니다.”
“그래?……. 그럼 성적이 좋았던 총을 좀 가져와 봐.”
명중률이 높았던 총들을 이들에게 주면서 쏘아보라 했다. 그랬더니 9발 모두가 거의 한 구멍으로 통과했다. 병사에 결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소총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낸 불량 소총이 18%나 됐다. 100점을 맞는다 해도 소총 불량 때문에 82점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불량 소총을 모아서 바꾸어 달라고 대대로 보냈다. 그 후 사단 병기부대장은 주월한국군 전체에서 불량 소총을 찾아내 교체한 부대는 필자부대 하나뿐이었다고 말해주었다.
이런 사격생활을 한 지 10개월 만에 주월한국군사령부에서 전투력 점검단이 내려왔다. 검열관 소령들은 도착하기가 무섭게 당번병, 취사병, 행정병 등 평소 사격훈련에 열외 되기 쉬운 병사들을 포함해 무작위로 36명을 불러 모아 서슬이 시퍼런 표정으로 손등에 도장을 찍었다. 실 거리 사격장은 6중으로 둘러싸인 철조망 밖에 있었다. 검열관들의 명령에 따라 내 병사들은 50m에서부터 350m에 이르기까지의 표적지에 1인당 50발씩 사격했다. 필자가 봐도 민첩하게 쏘았다. 이들은 탄창 속에 오물이 끼어 실탄을 잘 밀어내 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탄창 내부를 분해하여 기름을 칠해 놓았다고 했다. 그들이 착안해낸 것이었다. 36명이 쏜 1,800발 100% 모두가 표적에 명중됐다. 그런데 매우 기이하게도 칭찬을 해야 할 검열관들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필자의 얼굴을 노려봤다. 도시 영문 모를 일이었다.
“왜 그러십니까?”
“여보, 야마시를 쳐도 좀 그럴 듯하게 치소 100점이 뭐요, 100점이”
“제가 어떻게 장난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검열관님들께서 표적지를 손수 가져다가 꽂아 주십시오.”
이번에는 그들이 손수 병사들을 인솔해 나가 표적지를 설치했다. 그런데도 또 100점이 나왔다. 그러자 이번엔 다른 말을 했다. “여보, 포대장, 도대체 애들을 얼마나 잡아놨소. 아이들 움직이는 게 아주 민첩한데 저렇게까지 만들려면 애들을 얼마나 잡았겠소” 그들의 눈에도 확실하게 100점을 맞긴 했지만 그들은 도저히 100점으로 기록해 줄 수 없다고 했다. 100점으로 보고하면 자기들이 사령관에게 이상한 사람들로 비쳐진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기가 막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