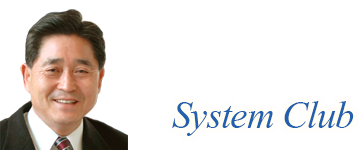|
|
북한의 조선예술영화 ‘생의 흔적’은 인민군 군관의 부인이 남편의 사망 후 고인의 뜻을 이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당과 수령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내용이다.
오늘은 ‘생의 흔적’의 실지 주인공 홍정화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남 출신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북한 당국의 끊임없는 차별과 제한, 감시 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위해 묵묵히 일한 결과 통일 후를 대비한 남한의 모 도(道)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또한 오빠들도 현재 군과 농장 관리위원회의 요직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다.
북한에서 군관의 아내였던 정화씨는 35살 나던 해 사고로 인해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협동농장에서 청춘을 다 바친 이름 난 여성애국자이다.
그는 이남출신임에도 믿어주고 내세워 준 당의 믿음과 배려에 충성을 다 바치는 것이 유가족으로서의 양심과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 간주하고 당의 지시와 방침 관철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자처한 ‘고난의 행군’이라는 험악한 현실에서 투철한 혁명성과 전사의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대하의 거품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평양의 지시와 방침은 그렇지 않은데, 왜 국가는 나날이 이 모양이 될까? 도 생각해 봤지만 모든 것은 김정일 밑에 있는 일군들이 허위보고만을 올려 그리 되는 줄로만 알았었다.
그는 밤마다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보고 또 보면서 어려운 시국에도 땅은 양심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일념으로 일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두 배로 끌어 올리는 기적을 창조했다.
여성의 몸으로 분 조장에서 반장이 된 후 낮에는 뜨락또르(경운기)를 운전하고 중국과 남한에서 비료가 들어가면 군과 관리위원회의 간부들이 빼돌리지 못하도록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낫을 쥐고 밤을 밝힌 등 수많은 사연들은 오늘의 추억이다.
하지만 당국의 대책 없는 미공급과 무보수노동에 강도 높은 정치생활, 조직과 단위별 통제는 북한 전역에 만연 된 직권 남용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변화하는 형국이다.
가을철이면 리 관리위원회와 농장의 간부들은 밤마다 탈곡한 곡물을 자기 집으로 나르기 바쁘고, 피타는 노력 끝에 얻은 정보당 수확고 4.5톤은 수포로 돌아가고 간부들이 빼낸 곡식 2.5톤의 누락으로 하여 결국 국가 검열이라는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검열내용은 모내기와 김매기 철에 동원 된 인원들(군인, 학생, 인민반원)을 위해 잡은 개, 돼지고기 값으로 지급한 곡식과 뜨락또르 운행에 들어 간 기름 값에 대한 지불이 비사회주의 행위라는 것이다.
리(里)와 농장 간부들에게 있어 원칙에 강하고 당의 결정과 지시 앞에서는 사리사욕이 없는 여성 작업반장은 늘 암초였고 눈에 든 가시 같은 존재였다. 독방에서 근 보름 남짓이 조사를 받으며 그는 총알받이에 떠밀러 온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일만 하고 대가가 없는 농장과 그것이 당연한 사회, 여기에 농사를 위해 쓰인 곡물이 비사회주의라면 이 땅에 비사회주의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금방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검열관에 의해 그 녀의 감옥행이 결정되고 벼랑 끝에 몰린 암사자를 의식한 군당과 관리위원회의 간부들의 “우리가 개조해서 쓰겠다.”는 눈물어린 탄원서에 의해 그녀는 또 한 번 당의 ‘크나큰 배려’로 풀려나게 되었다.
소 한 마리와 비닐박막 15장으로 정보당 수확고를 두 배 이상 끌어 올리고도 인정은커녕 머리를 깎고 죄수복을 입어야 하는 처지에 이르니 당국에 대한 배신감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
중앙 검열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사회주의 허무 성과 국가의 정책보다도 시장경제에 의존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북한 사회전반의 흐름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검열 후 몸져누운 그의 집으로 면회 온 관리 위원회 일꾼들은 풀죽이 들어 있는 밥솥을 열어 보고서야 “반장이 이렇게 살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김정일을 총대로 지키다 전사한 남편이 남겨둔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일 수 없는 어머니는 드디어 옥수수 3킬로그램을 팔아 중국행 탈북의 길에 올랐다.
한때는 군과 리 당에서 조직적으로 영화 ‘생의 흔적’의 주인공으로 모델을 만든다고 떠들었던 노당원이며 여성 일꾼인 그의 선택은 하루아침의 기분에 의해 결정 된 것이 아니다.
김정일을 알고 자신을 안 순간 ‘생의 흔적’은 살아 있는 존재의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인공은 2010년 10월 아픈 기억들로 가득한 북한에 대한 미련을 떨쳐 버리고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자유북한방송> 김정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