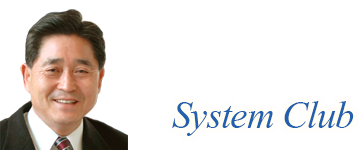대형마트 규제5년, 전통시장.마트 둘다 매출 감소 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05-01 11:57 조회3,62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표심'만 보는 규제 그만, 소비자 후생 생각해야"
소비자들의 불편과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유통산업 규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천문학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휴일 영업금지 등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실시되면서 장보기가 불편해지는 쪽은 소비자들이다. 장을 보기 위해 무심코 대형마트에 갔다가 허탕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쇼핑몰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 활성화는 커녕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쇼핑의 선택권이 줄어든 소비자들은 아예 쇼핑하는 횟수를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부 H씨는 "나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마트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전통시장에 가서 사지는 않는다"며 "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안먹는다'는 생각으로 쇼핑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유통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접근은 규제 강화 일변도다. '경제민주화'라는 사회분위기와 함께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높은 골목상권 상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요? 별 상관없어요. 이 앞에 백화점·마트가 들어서기전부터 여기서 장사를 했는데, 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했다고 매상이 늘지도 않았어요."
서울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한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상인 K씨의 말이다. 시장 바로 옆에는 대형마트가 자리해 있었다. 서울시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이후 매상이 어떠했는지를 묻자, 그는 대뜸 "솔직히 백화점, 대형마트를 가는 사람이랑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사람이랑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지 않나요? 우리 딸도 아이를 데리고는 전통시장 가기 어렵다며 마트를 간다고 하더라구요"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작된지 5년이 지났다.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로 시작된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규제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5년내내 지속되고 있다. 영업시간이 줄어든 대형마트의 매출이 줄어든 것은 당연했고, 대형마트 규제로 반사이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던 전통시장 역시 효과를 보지 못했다. 효과는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형 유통채널에 대한 규제는 강화 일변도다. 올해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주요 후보들도 일제히 유통 규제 강화를 공약에 내걸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복합쇼핑몰 의무 휴무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 교수는 최근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유통 규제법만 20개나 발의했다"며 "대부분 규제에 치중돼 있고 발전적인 청사진은 어디에도 찾기가 어렵다"며 대선공약으로 유통물류 선진화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교수는 "규제를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은 '상생'이라는 명분하에 대기업과 소비자의 양보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 2011년 12월 30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일과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012년 2월 전주에서 조례안을 공표하면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만 5년이 지났다.
규제 취지는 전통시장 활성화, 나아가서는 공익이다. 2011년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이듬해 2월 전주에서 조례안을 공표해 처음으로 규제가 시작됐을 때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도 유통법 위헌 여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등 공익달성의 필요성이 크다"고 각하 이유를 판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형마트 규제로 이익을 보는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다. 즉 '대형마트 영업을 막으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가겠지'라는 추측만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탁상법안'이라는 것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이후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시장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액은 2010년 8.1%, 2011년 9.1%의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규제가 시작된 2012년에는 성장률이 1.9%로 급감한다. 출점 제한과 영업일 제한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후 2~3% 수준에 그치다가 지난해 복합쇼핑몰과 창고형 할인매장 등의 성장으로 8.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렇다고 규제의 수혜를 입어야 할 전통시장이 살아난 것도 아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2010년 4980만원에서 2012년 4502만원으로 되레 줄었다. 2013년에도 4271만원으로 더 줄었다. 2014년 4472만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예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소비자들의 불편과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유통산업 규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천문학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휴일 영업금지 등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실시되면서 장보기가 불편해지는 쪽은 소비자들이다. 장을 보기 위해 무심코 대형마트에 갔다가 허탕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쇼핑몰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 활성화는 커녕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쇼핑의 선택권이 줄어든 소비자들은 아예 쇼핑하는 횟수를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부 H씨는 "나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마트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전통시장에 가서 사지는 않는다"며 "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안먹는다'는 생각으로 쇼핑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유통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접근은 규제 강화 일변도다. '경제민주화'라는 사회분위기와 함께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높은 골목상권 상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요? 별 상관없어요. 이 앞에 백화점·마트가 들어서기전부터 여기서 장사를 했는데, 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했다고 매상이 늘지도 않았어요."
서울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한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상인 K씨의 말이다. 시장 바로 옆에는 대형마트가 자리해 있었다. 서울시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이후 매상이 어떠했는지를 묻자, 그는 대뜸 "솔직히 백화점, 대형마트를 가는 사람이랑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사람이랑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지 않나요? 우리 딸도 아이를 데리고는 전통시장 가기 어렵다며 마트를 간다고 하더라구요"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작된지 5년이 지났다.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로 시작된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규제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5년내내 지속되고 있다. 영업시간이 줄어든 대형마트의 매출이 줄어든 것은 당연했고, 대형마트 규제로 반사이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던 전통시장 역시 효과를 보지 못했다. 효과는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형 유통채널에 대한 규제는 강화 일변도다. 올해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주요 후보들도 일제히 유통 규제 강화를 공약에 내걸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복합쇼핑몰 의무 휴무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 교수는 최근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유통 규제법만 20개나 발의했다"며 "대부분 규제에 치중돼 있고 발전적인 청사진은 어디에도 찾기가 어렵다"며 대선공약으로 유통물류 선진화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교수는 "규제를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은 '상생'이라는 명분하에 대기업과 소비자의 양보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 2011년 12월 30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일과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012년 2월 전주에서 조례안을 공표하면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만 5년이 지났다.
규제 취지는 전통시장 활성화, 나아가서는 공익이다. 2011년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이듬해 2월 전주에서 조례안을 공표해 처음으로 규제가 시작됐을 때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도 유통법 위헌 여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등 공익달성의 필요성이 크다"고 각하 이유를 판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형마트 규제로 이익을 보는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다. 즉 '대형마트 영업을 막으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가겠지'라는 추측만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탁상법안'이라는 것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이후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시장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액은 2010년 8.1%, 2011년 9.1%의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규제가 시작된 2012년에는 성장률이 1.9%로 급감한다. 출점 제한과 영업일 제한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후 2~3% 수준에 그치다가 지난해 복합쇼핑몰과 창고형 할인매장 등의 성장으로 8.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렇다고 규제의 수혜를 입어야 할 전통시장이 살아난 것도 아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2010년 4980만원에서 2012년 4502만원으로 되레 줄었다. 2013년에도 4271만원으로 더 줄었다. 2014년 4472만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예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