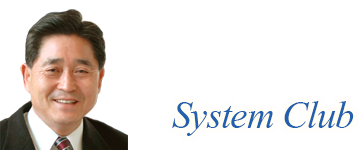허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6 14:54 조회10,58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열정적인 국가관, 연구에 대한 욕심, 더 배우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마흔 둘, 국방 분야의 선진관리 실태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에 갔다가 오는 길이었다. 창가 쪽으로 좌석이 세 개 있었고, 공교롭게도 내 양쪽에는 두 여인이 앉아 있었다. 창가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인, 복도 쪽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발랄한 여인이었다. 발랄한 여인이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꺼냈다.
“아저씨는 무어 하시는 분이라예”
“저요? 그냥 오파상 해요”
“장사꾼 같지 않은 데예”
“그럼 무어 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미국에서 사는 이야기, 한국에서 부모-일가들이 사는 이야기 등 등, 한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두 여인 모두 생각이 리버럴하고 맺힌 데가 없어 보였다. 시간이 가면서 창가에 앉은 30대 후반의 여인이 아프기 시작했다. 에어컨 때문인지 한없이 코를 풀며 추워했다. 코가 주체할 수 없이 나오자 민망해했다. 식사 때 확보한 두꺼운 냅킨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모양이었다. 나는 스튜어디스를 불러 사정을 설명하고 냅킨을 많이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한기가 돈다며 몸을 떨기 시작했다. 스튜어디스를 다시 불러 담요를 여러 장 더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재미있던 대화는 끊기고 괴로워해 하는 환자에 신경들을 썼다. 더 이상 앉아 있는 것이 너무 괴로운 모양이었다.
“누우세요. 우리들 무릎 위로 다리를 올리세요”
발랄한 여성이 이렇게 제안했다.
“체면이 말이 아니지만 그래야겠어요. 용서하세요”
나는 담요 한 장을 내 무릎 위에 깔았다. 그 위로 그녀가 다리를 얹고 눕자, 모든 담요를 합쳐 두껍게 덮어 주었다. 그녀의 다리가 자꾸만 밑으로 흘러내렸다. 나는 밑에 갈린 담요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그녀의 다리가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도록 잡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편안해하면서 깊은 잠에 빠졌다.
어느 듯 비행기는 동경에 도착했다. 그녀가 황급히 일어나 가방을 챙기더니, 출구를 향해 뛰듯이 달려 나갔다. 정신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민망해서였는지 고맙다 잘 가라 그런 인사도 없었다. 트랩을 내려가려던 그녀가 갑자기 돌아서 오더니 명함을 한 장 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잡아채듯이 가지고 나갔다.
“고마웠어요. 잘 가세요”
서울에 오자마자 나는 설악산에서 열리는 경영학회 세미나에 며칠간 갔다. 그 사이에 사무실로 전화가 몇 번 온 모양이었다. 설악산에서 돌아와 사무실에 출근은 했지만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전방과 국방부 등에 부지런히 다녔다.
“어느 여성분으로부터 전화가 여러 번 왔었는데 오늘도 왔었습니다” 여비서의 말이었다.
“그래? 내가 피하는 줄로 오해할지모르니, 다음에 전화 오면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남겨달라고 해”
어느 날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었다.
“여기 언니네 집이예요. 제가 서울 스케줄이 매우 바빠요. 오늘 저녁 식사 할 시간 있으세요?”
8군 영내 장교 클럽, 희미한 불빛에 마주앉아 와인을 곁들여 식사를 했다. 처음 갖는 식사기회였지만 두 사람은 금방 친숙해졌다.
“이게 오파상 명함이야?”
기내에서 받았던 명함을 테이블에 던지며 눈을 흘겼다. 그녀는 미국 어느 직장의 중견 간부였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녀는 어린 아이처럼 즐거워하면서 노래까지 흥얼거렸다.
“우리 나갈래?”
“나가서 뭐하게”
“산보하게”
“그래”
두 살 차이였다.
장교클럽 마당 코너에는 고목의 은행나무가 있었다. 밑에서 올려 비친 불빛에 나뭇잎들은 황금색 발광체처럼 아름다웠다. 나무 위에서 불을 내려 비추면 나뭇잎이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밑에서 위로 조명을 쏘아주면 나뭇잎들이 발광체로 변하여 참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소리는 작게 냈지만 그녀는 신나해 하는 몸동작으로 노래를 몇 곡 불렀다. 스스로 자랑한 대로 그녀는 노래 선수로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얼마나 멋있고 근사한지에 대해 은근히 자랑들을 늘어놓았다. 며칠 후 북악산 팔각정에 올랐다. 당시 포니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진지로 투입되는 병사들이 차를 세우면서 태워 달라했다. 태웠다가 내려 놔 주기를 두어 번, 그녀는 내게 눈을 흘겼다. “데이트 하러 가는 거야, 자선사업 하러가는 거야”
그리고 며칠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무 바빠 시간을 더 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곧 공항으로 나가는 길이라 했다.
“공항에 나갈까?”
“아냐, 공항에 아는 사람들 많이 나와. 미국에 오면 꼭 연락하는 거 알지?”
비행기가 이륙한다는 오후3시, 연구소 창가에 섰다. 샛노란 낙엽이 가을바람에 곱게 흔들리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갑자기 허공에 떠 있는 그림자처럼 보였다. 갑자기 가슴 속이 텅 비어지고 있었다. 노란 단풍이 우거졌던 8군 영내의 은행나무 아래서 그녀가 나지막하게 불러주던 노래들이 환청으로 다가왔다. 내 뺨에 살포시 대주던 그녀의 뺨에서 뿜어나던 서늘함이 가슴을 더욱 시리게 했다.
바삐 돌아가는 연구생활, 현실타파에 대한 도전과 다툼 속에서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그 창가에 섰다. 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흰 눈 가래가 하나씩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미국에서 온 크리스마스카드가 놓여 있었다. 반가워야 할 그 크리스마스카드가 쓸쓸해 보였다. 가을이 되면 찾아드는 낭만의 병, 우수(melancholy)!
열아홉, 스무 살 때에는 스치는 바람결과 흔들리는 풀잎에서 우수를 느꼈다. 그리고 그 우수는 마흔 두 번째 가을에 한 번 더 찾아 왔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