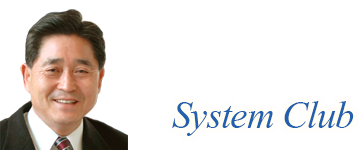직각 식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7 16:38 조회20,43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식당은 800명 정도의 생도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직사각형 식탁에는 1학년으로부터 4학년까지 골고루 편성된 9∼10명의 분대원들이 양쪽으로 갈라 앉았다. 식탁의 한쪽 끝에는 1학년 생도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으며, 그들 앞에는 10명분의 밥통과 국통이 놓여 있었다. 1학년은 각기 납작한 접시에 밥과 국을 담아 식탁의 반대 끝으로부터 서열 순으로 앉아있는 상급생들에 차례로 돌렸다. 밥은 쌀과 보리가 반반씩 섞인 것이었고, 국은 콩나물국, 갈치국, 잡채국, 돼지고기국, 그리고 가끔씩은 황우도강탕이라고 불리는 멀건 소고기국들이었다.
의자를 앞으로 바짝 당기고 몸을 꼿꼿이 세운 후 직각식사를 해야 했다. 밥이나 국을 커다란 군용 숟가락에 떠서 천장을 향해 입 높이만큼 올린 다음 입을 향해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식사 자세와 매너에 대해서는 상급생으로부터 일일이 감시를 받았다. 이러한 식사 자세는 처음엔 좀 불편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었지만 지내놓고 보니 도움이 됐다. 나중에 미국에 가보니 미국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 아이들을 데려와, 이러한 식사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의자를 바짝 당기고, 몸을 꼿꼿이 세우고, 소리를 내지 말고, 식탁 위에 팔을 얹지 말며, 접시와 입 사이를 포크가 왕복하는 식의 식사 자세였던 것이다.
배고픈 1학년 시절,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 1987년은 내가 졸업한지 22년째 되는 해였다. 동기생들은 대개 대령들이 되어 있었다. 4명이 강남 중국식당에서 유쾌하게 저녁식사를 했다. 취기가 오를 무렵 두 동기생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한참 뜨거워지더니 A 대령이 B 대령에게 협박을 했다. “야, 임마! 그럼 그거 폭로할 거야.” 기세가 등등하던 B 대령이 갑자기 꼬리를 내렸다. 옆에 있던 동기생들에게 호기심이 발동했다. “야, 좀 알고나 지내자. 다 늙어 가는 마당에 아직도 비밀이 있냐? 어서 말해봐.” A 대령이 B 대령의 눈치를 살폈다.
“야, 저놈아 있잖아. 나 참, 이 얘기를 해야 하나? 1학년 때 저놈아 하고 나하고 한 내무반에 있었잖냐?”
“그랬지!”
“저녁 식사 때, 돼지 고깃국이 나왔더라고? 그 고깃국을 저놈아가 배식한 거야. 어떻게 뜨다 보니 나한테 커다란 고깃덩이가 들어왔더라고? 얼마나 신났겄냐. 야, 자식 참 의리 한번 있네! 했지. 식사 전에 왜 묵념을 안 했냐? 묵념은 무슨 묵념? 눈은 감았지만 고깃덩이만 눈에 선∼하더라고? 아, 그런데 말이야, 참, 기가 막혀서! ……”
“뭔데 그래, 뭔데 그렇게 입맛을 다시냐.”
“아, 글쎄, 그런데 말야!……”
뜸을 들이는 동안 B 대령의 얼굴이 붉어지고, 안절부절 했다.
“아, 글쎄 저놈아가 말이다…… 내 참 이 말을 꼭 해야 하나?”
“야, 임마, 뜸 좀 그만 들여라.”
“묵념이 끝나자마자 그 접시부터 안 보았겄냐?”
“그런데?”
“아 글씨 말이다. 그 커다란 고깃덩이가 저놈아 접시로 옮겨졌지 안았것냐? 번갯불에 콩 볶아먹게 잽싸더라고∼, 참 내 기가 막혀서.”
이 말을 들은 2명의 눈이 B대령에게 집중되면서 배꼽들을 뺐다. 한참을 웃은 후 A 대령의 말이 이어졌다.
“굉장히 괘씸하고 치사해 보이더라구∼ 내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겠냐. 아이, 뭐 저런 게 다 사관생도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글씨, 그런데 말야. 식사가 끝나자마자 식중독 소동이 안 벌어졌겄냐.”
“그래서.”
“그날 돼지고기에 문제가 있었더라고∼. 아, 근데 말야, 바로 저놈아가 배를 움켜쥐고 뒤진다고 대굴대굴 구르는 거야. 가장 큰 걸 먹었으니 더 오지게 걸리지 않았겄냐? 한 내무반에 있다는 죄로 내가 저늠알 업고 병원엘 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소하더라고? 아이구, 참! 그 때부터 저놈아가 나한테 약점이 콱 잡혀버렸지 않았겄냐”
나중에 B대령은 투-스타까지 진급한 후 예편했고, A 대령은 고참 대령으로 예편했다.
주말에는 통상 외출을 나갔다. 썰물처럼 생도들이 빠져나가 버린 토요일은 샤워장이 한산했다. 외출하기 전에 내복 빨래는 각자가 샤워장에서 빨아 널어야 했다. 빨랫감을 가지고 샤워장엘 갔다. 들어가자마자 동기생이 벽을 보고 쪼그려 앉아 빨래를 문지르고 있었다. 얼굴이 불그레하고 살집이 희멀건 것이 영락없는 동기생이었다.
“야, 김 아무개 생도! 너 왜 외출 안 나갔니?”
대꾸가 없었다. 오히려 고개를 더욱 숙이고 빨래를 문질렀다. 나는 그가 장난치는 줄 알고 넓죽한 궁둥이를 발로 여러 번 툭툭 걷어찼다. 그래도 빨래만 했다. “야, 김 아무개 생도 안 들려? 나 좀 봐, 나 좀, 이 멍청아.” 이번엔 아주 힘껏 걷어찼다. 그래도 무반응이었다. 순간적으로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그의 어깨 위로 빼고 들여다보니 아뿔사! 그는 동기생이 아니라 4학년생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연대장 생도였다.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빠져나와 내무반으로 줄행랑을 쳤다. 그 4학년생도 역시 속으로 많이 웃었을 것이다.
생도대에서 교수부까지는 400m 쯤 된다. 교수부로 공부하러 갈 때에는 시가행진 대열로 군악대의 우렁찬 밴드 곡에 맞추어 행진해 갔다. 밴드 행진은 언제나 신났다. 일단 행진이 끝나면 동기생끼리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해방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모처럼의 이 기분마저 박탈하는 2학년생들이 있었다. 악질파 2학년생들이다. “귀관! 이따 오후 6시 정각에 완전군장하고 우리 내무반으로 와! 알았나?” 이렇게 걸린 1학년의 하루 공부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