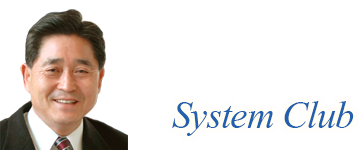어느 입교생의 첫 마디, “형씨, 장군은 언제 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7 16:44 조회20,93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962년 1월말, 합격자들은 사관생도가 되었다는 부푼 가슴을 안고 사관학교로 들어갔다. 잘 가꿔진 광활한 정원처럼 보였다. 숲 속에 고색창연하게 묻혀있는 붉은 벽돌건물, 노란 잔디밭 양쪽에 납작하게 가라앉은 흰색 내무반 건물들, 멀리서 보기엔 모두 그림처럼 환상적이었다.
‘아, 이제부터 멋진 옷을 입고, 저 하얀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
가슴이 설렜다. 하지만 녀석들이 안내된 곳은 교정과는 거리가 먼 후미진 곳이었다. 우중충하고 초라하게 지어진 2층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작업복, 탄띠, 배낭, 담요, M-1소총, 군화…… 등 볼품없고 겁나는 보급품들만 한 아름씩 지급됐다. 모두가 실망하는 눈치들이었다. 숫기 있는 풋내기 몇 명이 안내자처럼 보이는 무표정한 형씨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친구는 그 형씨가 하사관쯤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가 선배 사관생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보소, 형씨, 사관생도 옷은 언제 주능겨?”
“이 작업복은 뭐 칼라고 주능겨?”
“형씨, 작업복이 어찌 이리 크다요? 땅걸로 바꿔주면 좀 안 쓰겄쏘?”
“형씨, 장군은 언제 된당가요?”
그 안내자는 실실 웃음을 참아가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드디어 그 형씨는 풋내기들에게, 입고 왔던 사복을 모두 벗어놓고 지급된 군복으로 갈아입으라고 명령했다. 지급된 옷들은 모두 미제였다. 맨 먼저 러닝셔츠를 입었다. 그 조끼 식 러닝은 하도 커서 끝단이 무릎 밑을 덮었다. 상체를 덮기 위한 옷이 아니라 임신부용 치마 같았다. 팬티는 허리를 감고도 두 뼘이나 남는 것이어서 입을 일이 난감했다. 짜개 단추로 허리를 여미는 것이라 잠근다 해도 가느다란 허리를 타고 그대로 흘러내리기만 했다. 나는 옛날 촌 바지를 입듯이 똘똘 말아 허리춤에 찔러 넣고 그 위에 그보다 더 큰 작업복을 입은 다음 허리띠를 졸라맸다. 작업복 가랑이는 무릎에까지 축 내려갔고, 상의에 달린 주머니는 허리띠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폼을 재던 풋내기들도 그런 복장 속에서는 별 수 없었다. 형씨는 이들을 3열종대로 인솔해서 창고같이 생긴 컴컴한 건물 속에 설치된 샤워장으로 데리고 갔다. 녀석들은 본능적으로 적당한 곳에 옷을 벗어 포개놓고 샤워를 시작했다. 동작이 빠르고 덩치 있는 친구들은 샤워꼭지를 차지했지만 나는 그들이 샤워를 마친 후에 하리라 마음먹고 샤워꼭지가 비어지기를 신사적으로 기다렸다.
그런데! 난데없이 상급생들이 벌떼같이 나타났다. 그들은 작업복을 몸에 딱 맞게 맞춰 입고 있었다.
“샤워 끝 3분전.”
부푼 꿈에 도취돼 있던 풋내기들은 그 구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샤워 끝! 샤워장 앞에 3열종대로 집합!”
구령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급생들은 무서운 얼굴을 해 가지고 선머슴들의 어깨를 사정없이 치고 다녔다. 여기저기서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야!” 비명도 들렸고, 억압된 신음소리도 들렸다. 풋내기들은 그제야 위기를 직감하기 시작했다. 나는 샤워꼭지 한 번 차지해보지도 못하고 동작 빠른 놈들의 몸에 맞고 튄 물방울만 뒤집어쓰고 있다가 수건으로 물기를 닦기 시작했다. 어느 새 옷을 다 입고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녀석들도 있었다. 나는 물기를 채 닦지도 못한 채 겁에 질려 옷을 입기 시작했다. 물 묻은 다리에 얇은 포플린 팬티가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원체 다급해지니까 다리에 휘감긴 팬티에서 가랑이를 찾을 수 없었다. 드디어 한쪽 가랑이로 두 다리가 들어가 버렸다. 한쪽 다리를 빼내려 해도 일단 달라붙은 천은 몸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상급생이 “귀관 뭐하고 있나!” 하면서 나를 밀어 제쳤다. 조금만 더 세게 밀었다면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을 것이다. 뒤로 자빠져 있는 상태에서 두 다리를 한쪽 가랑이에 모두 집어넣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보자 목석같은 선배의 눈에서도 실낱같은 웃음이 스쳤다. 맨 앞에 나온 몇몇 녀석들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토끼뜀 기합을 받았다. 육사생활은 이렇게 일방적인 강압과 억지로 시작됐다.
체면 같은 것은 없었다. 모두가 토끼몰이의 대상이었다. 어떤 녀석은 첫날에 코피를 흘렸고, 어떤 녀석은 찔찔 울기도 했다. 나는 울고 싶다기보다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하루 종일 이들은 옆 전우와 말 한마디 건넬 여유도 없이, 완전히 얼어 있었다. 각자는 오직 선배 생도와의 1대1의 관계를 맺는 새로운 실존세계에서 외로운 존재가 됐다. 눈알만 반들거릴 뿐, 말이 없었다. 공포와 고통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했다. 이들 편에 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밤 10시부터 차가운 밤공기를 타고 애틋하게 울려 퍼지는 솔베이지송 뿐이었다. 가슴속을 파고드는 그 부드러운 곡만이 이들의 팔락이는 영혼을 벌떼 같은 선배들로부터 떼어내 조용한 꿈나라로 인도해주는 자비로운 여신이었던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겁이 많았다. 맏형은 나보다 열여섯 살이나 위였다. 내가 다섯 살 되던 해에 큰 형수님이 열아홉 살 나이로 시집을 왔다. 형수님은 늘 고운 옷을 입고 나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하면서 도련님이라고 불렀다. 형수님은 나를 업고 이웃 가게에 가서 엿도 사주고, 냇가에 데려다 놀게도 해주었다. 소풍을 갈 때에는 10 리만큼 마중을 나와 나를 업고 집에 오곤 했다. 시골에서 밤 변소를 갈 때면 만만한 위의 누나를 불러내 보초를 세웠다. 앉아 있으면서도 보초를 제대로 서게 하려고 계속 말을 시켰다. 어쩌다가 대답을 안 하면 겁에 질려 숨차게 뛰어 나왔다. 시골에서는 동네 형들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받았고, 서울에서는 힘세고 나이 많은 동창들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보호를 받는데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육사에서의 이 하루하루는 연약하게 자란 나를 180도 바꿔놓기 시작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